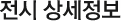토마스팍 갤러리는 박지원의 첫 번째 개인전 Organically를 선보인다. 박지원의 작업은 이원적인 개념들, 도예와 조각, 자연과 신체, 기능과 추상의 경계를 직관적으로 넘나들며 존재한다. 그녀는 흙이라는 물질의 반응성을 탐구하며, 자연의 힘에 의해 형성된 듯한 유기적인 형태를 만들어낸다.
박지원은 서강대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한 뒤, 이화여대에서 도자예술로 석사학위를, 그 후 영국 Cardiff Metropolitan University Ceramic & Makers에서 다시 석사학위를 받았다. 영은미술관과 용인문화재단 등에서 수차례 개인전을 가졌으며, 국내와 해외에서 많은 그룹전에 참가하였다. 그녀의 작품은 아름지기 재단과 영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THOMAS PARK
4F, 199, Itaewon-ro, Yongsan-gu, Seoul, Korea
Wednesday–Saturday, 11 A.M.-6 P.M.
info.thomaspark@gmail.com
02-794-2973
글 박상미
토마스팍 갤러리 입구에는 도덕경 2장의 번역 문구가 벽에 새겨져 간판 대신 갤러리 입구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갤러리로 들어가듯 도덕경 2장과 함께 이 글을 시작해 본다. 도덕경 2장에는 도덕경에서 거의 유일하게 아름다울 미美 자가 등장한다. 2장의 도입 부분은 “어떤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추한 것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는데 이는 현대 미술의 미의 개념을 향한 도전 정신과 관련 있다. 2장은 그렇게 시작해서 이 세상의 대립되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서로를 존재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나는 도덕경의 영어 번역을 사용했는데, 알려진 뉴욕파 시인이자 무용평론가인 에드윈 덴비(1903-1983)의 번역이다. 덴비는 번역을 느슨하게 접근하며 대립된 것들의 상호의존성을 표현할 때 무용의 움직임을 연상시키는 동사들을 사용했다. 동양의 철학과 서양의 무용비평가의 언어가 절묘하게 만나는 지점이었다. 나도 박지원의 전시를 시작하며 몇 개의 동사들을 생각해 보았다.
몸을 틀다 TURN
박지원의 작업은 태생적으로 대립되는 것들의 경계에 존재한다. 동양과 서양, 공예와 조각, 식물과 동물 등이다. 그녀는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한 후 방향을 틀어 도예를 공부했는데, 도예가가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흙이라는 재료의 물성에 끌렸다고 한다. 그녀의 어머니는 조각가이다. 그녀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녀는 처음부터 조각가처럼 생각했는데, 도예를 선택했다. 도예가와 조각가는 실제로 흙이라는 재료에 그 근원적인 공통점을 둔다.
그녀는 인터뷰 도중 굴성운동tropic movement/tropism에 대해 언급했다(작업들의 제목이기도 하다). 자신의 작업의 조형적 형태는 식물이 굴성운동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며, 자신의 작업 전개 과정도 식물이 굴성운동을 하듯 자신이 놓인 삶의 환경에 반응하며 진화해 왔다고 했다. 굴성운동을 뜻하는 “tropism”의 어원은 “turn”으로, 식물이나 생물체가 외부 자극에 반응하여 특정한 방향으로 몸을 트는 생리적 반응을 의미한다. 식물이 빛의 방향에 따라 몸을 틀어 자라거나 어떤 접촉이 생기면 방향을 틀어 뻗어가는 것을 떠올리면 된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환경에 반응하여 방향을 바꾼다. 박지원도 삶에 반응하듯 흙이라는 물성에 반응해 왔다. 그녀의 작업의 두드러진 조형적 특징은 이들이 식물을 연상시키기도, 동물의 몸을 연상시키기도 한다는 것이다.
담다 HOLD
나는 박지원 작가의 작업을 처음 보았을 때 “관능官能”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작업의 형태가 사람의 몸통을 트는turn 듯 보이기도 했고, 나른하게 흘러내린 듯한 흙의 질감이 느껴지기도 했고, 꽃처럼 무언가 제 몸을 열어 피어나는 모습이기도 했다. 나는 언제나 “관능”을 품격 있는 단어라 생각해 왔는데, 그 사전적 의미는 이러하다.
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기관의 기능. 이에는 폐의 호흡 작용, 눈의 시력 따위가 있다.
오관(五官) 및 감각 기관의 작용(예: 커피 향미의 관능 평가는 후각, 미각, 촉각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육체적 쾌감, 특히 성적인 감각을 자극하는 작용.
(국립표준어대백과 사전 참조)
관능의 한자어는 벼슬 관官 자에 능할 능能 자를 쓴다. 벼슬 관官에는 기관, 역할이라는 의미가 있고 능能은 기능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이 단어는 기관器官의 기능, 우리 몸의 기관의 역할이라는 의미가 강한데 우리는 3번의 의미로만 사용한다. 내가 특별히 “관능적”이라 생각한 것 중에 섬진강이 있다. 섬진강은 힘있고 완만한 곡선으로 흘러 너그럽고 따뜻한 생명을 떠올리게 했다. 관능은 말초적인 욕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생체 기관의 역할, 즉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와 관련있다.
관능이라는 단어가 우리 생체 기관과 관련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운데, 기관器官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일정한 모양과 생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생물체의 부분”이고, 그 한자어는 그릇 기器 자에, 역시 벼슬 관官 자를 쓴다. 즉 우리의 생체 “기관”은 ‘기능을 하는 그릇’이란 뜻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관官자에서 파생된 글자로 파이프를 의미하는 대롱 관管이 있다. 신기한 것이 영어에서도 기관을 뜻하는 organ의 어원이 어떤 기능을 하는 “기구, 도구”이고, 이것이 관管을 가진 악기, 오르간이라는 의미로도 변형되었다. 이는 다시 조직organization이라는 단어가 되기도 하니 동서양의 단어의 유사함이 신기할 정도이다.
우리 몸의 기관이라는 단어에 그릇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에선 한 사람의 잠재성을 표현할 때도 “그릇”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얼만큼 담을 수Hold 있느냐의 문제를 보는 것이다. 인간이 처음 만든 도구 중 하나가 토기였던 것을 생각하면 담는 행위는 인간성의 첫 증거이자 그 평가의 궁극적 기준이 되기도 한다.
펼치다 UNFOLD
박지원의 가장 최근 작업들은 펼쳐지는 형상을 하고 있다. 마치 사람의 몸통이 몸을 틀다가 그 형체를 열어 피어나는 듯하다. 갈라진 부분들은 마치 꽃잎처럼 얇은 느낌인데 연약할 듯하면서 강한 생명력을 보인다. 닫혀 있던 것이 결국 피어나는 순간을 포착한 듯하다.
나무 그루터기 또는 몸통을 연상시키는 작업들은 스툴로도 사용이 가능해서 공예가 가진 특성인 유용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형태가 열리게 되면 스툴로서의 유용성은 사라지지만 조각과 그릇 사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형태가 된다. 이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도덕경 2장에서 상반된 개념이 역동적인 동사들로 연결되듯, 전개된다. 그래서 이번 전시도 그녀의 작업 세계가 펼쳐지는 형식으로 구성하고 디자인했다. 몸을 틀고, 담고, 펼치는, 유기적인 과정이다.